정념은 신체적 쾌⋅ 불쾌와 동시에 정신적 선⋅ 악에 일치하여 기쁨과 슬픔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인식적 가치평가에 일치하여 존경과 경멸을 형성한다. 이는 정신과 신체의 이중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념이 양자에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신체의 나쁜 상태에 대해 좋은 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정신에 의해 확인된 가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념을 통해 이질적인 양자를 하나로 묶으며 하나의 통일체가 된다. 인간은 확실히 우주 속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이로운 존재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정념과 비슷한 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비자연적 힘인 정신적 자유의지를 갖지 않으므로 다른 동물들의 정념에서는 가교적 역할에 의한 통일 형성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없다.
이 점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순수 예지력에 의거하는 영적 존재인
비자연적 신도 자신이 창조했다는 자연과의 불일치를 자체의 존재양태로 인해 통일 속에서 해소하지 못한다. 신은 오히려 이 불일치의 해소보다는 자연의 파괴로 불일치를 소멸시킨다. 우주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을 지닌 육체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존재다. 적어도 파괴에 의한 것보다는 통일에 의한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정념은 신체에 상응하지만 신체를 행위로 이끈다는 점에서 정신적 속성도 가진다. 그러나 순수한 비자연적 요소인 능동적 자기법칙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과 구별된다. 이러한 불일치에서 우리가 도출하는 것은, 정념은 양자에서 독립된 자기 경로와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정념이 가지는 이 불일치로서의 독자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불일치의 완전한 해소 인 회향을 추구하는 존재인 한, 불일치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육체와 정신과 정념의 삼위가 일체로 통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정체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회향적 인간이 가져야 할 소양이다.
자연은 불일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에, 회향은 오직 비자연적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회향에서 제일의 문제는 정념과 정신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망은 오직 우리가 육체와 정념과 정신이 공유하는 일치, 삼위일체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지상 목표인 일체의 불일치가 완벽하게 해소된 회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회향을 추구하는 개인이 가장 먼저 구비해야 하는 소양은 삼위일체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회향적 개인은 우선 정념과 정신의 통일인 믿음과 신념과 양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삼위일체를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오직 인격해방을 위한 창조, 즉 인간의 자유를 지향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도, 정념도, 의지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존재적 결여 속에 있는 존재를 최고의 완전성으로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의를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인간이 회향적 존재라면, 즉 회향을 향해 전진하는 존재라면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정념에서 발견한다. 즉 우리는 감성을 통해 받아 들인 것이 정신 및 육체와 불일치를 이룰 때, 이 불일치를 인식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정념을 통해 감지한다.
그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의지다. 정신 자체는 일치를 이룰 뿐이다. 정신에서의 불일치는 자아와 상이한 비아의 관계에서만 볼 수 있다. 비아에 대한 인식과 오성능력의 불일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아가 비아를 자아 내부로 수용할 때, 자아는 육체적 수단, 즉 촉각, 청각, 시각 등에 의해 그것을 정신과 대비하며, 이때 정념이 작동한다. 정념에는 비아와의불일치를 감지하는 힘이 존재한다. 정념이 불일치를 감지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일치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정념은 의지에 비하여 수동적 반영 역할을 한다. 불일치에 대항하는 힘인 인식과 의지가 종결되더라도 불일치가 남아있는 한 이러한 불일치의 반영인 정념은 여전히 남는다. 인간은 회향 과정 속의 부단한 투쟁의 주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받아들이고 감성 형식과 오성형식을 거쳐 인식을
형성하기까지 투쟁은 유보되어 있다. 한편 우리가 자유의지를 포기할 때 그 끝에서는 정념만이 투쟁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인식과 자유의지가 힘차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정념이 상대적으로 유보된다. 이처럼 두 경로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인식의 결여에 대해 불쾌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념이지 결코 의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념은 감각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육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것을 보완하는 면에서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정념은 양자의 가교다. 이 가교에 의해 인간은 육과 영의 통일체일 수 있다. 의지가 유보되어 있을 때에는 정념이 인간 행위를 결정한다. 이것은 정감이 육체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만약 정념이 없다면 전혀 별개의 성격을 띠는 영과 육이 어떻게 상호 불일치 관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 상호 대비는 동일한 질로 전환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헤겔의 논리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영과 육의 불일치를 감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가적 존재, 즉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정념이다. 그러나 정념은 단지 불일치를 감지하 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정념에 따르는 것으로는 결코 불일치의 해소에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정념이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 정념에 다른 때에는 저 정념에 따른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반대하게 되고 정신은 부자유스럽고 불행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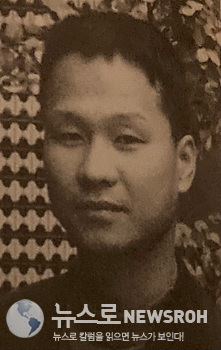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노천희, 내님 불멸의 남자 현승효’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nbnh&wr_i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