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추리와 합리적 논리
종교적 신앙이 인식보다 더 원초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예컨대 다음 순환논법에 근거한다. 즉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이며, 성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신에게서 유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 자가당착적 순환논법에 정당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뿐이다. 이 경우 논리가 설 자리는 전혀 없고 단지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군림한다.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자는 자신의 자연적 이성을 통해 추리한 후 궁극적으로 믿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가 이성적 인식의 한계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이성을 배제하면 인간의 이중적 정신 경로 가운데 남는 것은 오직 정념적 경로밖에 없는데, 믿음은 바로 정념적 경로인 셈이다.
데카르트가 지적하듯이, 지혜의 서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들에게 우주를 탐색할 만큼의 지식이 있었다면 왜 더 일찍이 그들의 주를 발견하지 못했던가.” 여기서도 신의 발견은 분명히 인식이 수행되고 난 이후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1장 19 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는 구절이 있다.
데카르트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지적한다. “신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름 아닌 우리들의 정신 그 자체 내에서 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여기서 그는 신을 인식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존재하는 완전성인 신, 즉 실재적 완전성으로서의 신이 가능성의 실재화 가운데 하나인 인식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작업이며 인식의 희롱이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인식이 이미 끝나는 그 한계점에서 인간은 무한량으로서의 운동을 포착했을 뿐 그것을 완결시킨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의 완결을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의 종점에서 이 완결의 원형인 신이 요청되는 것이고, 이 신은 이미 인식의 영역 바깥에 있다. 이 신을 인식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월권이다. 문제는 이 요청된 신을 믿느냐 아니면 독자적 경로로 자유의지를 구사하느냐이다.
오류추리에 근거하는 거대한 사고 전통은 존재와 본질의 선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교적 해석에는 놀랄만한 오류들이 집적되어 있다. 인간이 제약성 속에 있음을 자각한 자는 필히 그 제약성을 가능케 한 무제약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소급의 원리, 통정적 원리는 인간 이성의 사실이다. 확실히 통정적 원리에 의거하는 사고는 이 사고를 위해 요구되는 사실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전제를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 무제약성에 도달했을 때, 가능성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제는 실재성을 얻었다고 믿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이렇게 얻은 실재성에 근거해 모든 것을 역으로 오류추리와 합리적 논리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일한 길을 다시 내려오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현존재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 감탄하 며, 그것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느낀다.
물론 처음 이 길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희박하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통정적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정된 관념이 실재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해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신앙의 정체다.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기에 현실에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없다. 통정적 원리는 인과율에 뿌리박고 있는 원리이며 우리는 정말 우연히도 그리고 다행스럽게 인과율에서 부분적 으로 진리를 획득하지만, 인과율 자체는 진리와 거리가 있다. 귀납과 연역이라는 것은 인과율의 변형으로서 단지 그 방향만 서로 역순을 이룰 뿐이다. 양자는 모두 하나의 직선적 연쇄에 의한 사고 유형이다.
인류가 변증법적 논리를 발견하기 전 단계의 논리는 모순 배척의 합리적 논리였다. 이러한 사상은 낙천적 이성주의의 원조인 소크라테스 이래 수천 년에 걸쳐 전 인류를 지배해온 강력한 정신적 유산이다. 그러나 모순 배척의 논리야말로 당착에 의한 논리이며, 오류추리의 전 역사를 관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순 배척의 논리는 인식에 대한 맹신에서 성립된 것이다.
인식의 한계와 그 부분적 타당성을 아는 이상, 인식에 가장 확고한 신뢰를 부여한 합리적 이성주의는 오류의 누적에 의한 논리임도 알 수 있다. 인식능력이란 자투에 의해 생성된 것인데 이 인식능력의 이차 산물인 언어에 의한 개념이라는 것은 오성의 무수한 오류의 누적이기 때문에, 이 오류의 누적에 의한 판단, 즉 인간의 진리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절대적 진리는 이념적 가상이다. 이것을 인류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오류추리의 역사와 비교할 때 특히 최근의 사실이다. 이러한 발견에 의해 논리학과 인류의 사고방식은 과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러도 좋은 전환을 맞이했다. 인식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비롯된 모순 배척의 합리적 논리학에서 그 논리전개의 전제로서 도입하는 것은, 언제나 인식의 본질인 비아(非我)에 대응하는 가변적 가능성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현실세계와는 관련이 먼 사물의 동일성, 즉 다른 시점에서도 동일한 사물의 자기 동일성이다.
화학에서 물을 H2O 로 정의한 것은, 이 물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나, 이는 단지 가상일 뿐이다. 이는 수학에서 첨예화 될 수 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엄밀한 의미의 직선, 원, 양의 절대적 척도, 그리고 전적으로 같은 것이 존재한다 는 전제 하에서 수학의 전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합리적 논리학자들은 어떤 확고한 제일원리를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형성되어가는 가변적 양태를 불변 사항으로서 있어야 할 것으로 전제하는 인식은 오류다. 가변적인 것을 불변적 척도로 삼았다는 것을 그들이 좀 더 일찍 자각했다 면 인류의 인식은 더욱 전진해 있을 것이다.
실재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의 불명확한 구분이야말로 오류추리의 정체다. 순전히 실천적 전제에서 성립된 수학에서는 오히려 이 분리의 명확함을 통해 수학적 진리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수학은 전제와 결과가 일관되게 형성된 직관에 의존해 있다. 이와 같이 모순 배척의 합리적 사유에 의해 가변적인 것이 불변적 사실로 포착되고 일체의 변동 과정은 고정되어 버리므로, 그렇게 얻은 진리는 과정의 고착에 의한 부분적 진리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루한 인식론자들은 이 특정 부분적 인식에 절대적 신뢰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식에 절대적 신뢰를 부여한 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르치지만 과학을 통해 그 역이 증명되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 예는 과학적 발견에서 무수히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모순 배척의 합리적 사고가 절대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합리적 사고에 의해 웅변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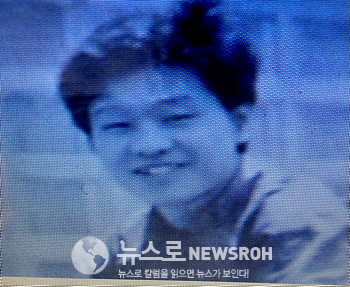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노천희, 내님 불멸의 남자 현승효’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nbnh&wr_i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