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 회향의 원리
제1장 회향적 존재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든 사상체계는 현재 상황을 파괴되어야 할 질곡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운동성 내지 투쟁성이 불변의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현재 상황을 파괴되어야 할 것으로 다루는 운동에서 모든 다양성을 추상하고 운동만을 파악할 때, 이 운동의 본질은 불일치에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경신이고 자기전개다. 운동이 실제로 역동적이려면, 그것은 불일치의 고착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경신과 부정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서 운동의 최고 형태를 본다. 이 최고 형태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 투쟁은 불일치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투쟁은 불일치에서 유발되며 일치를 지향한다. 이는 인간의 자기입법적 본성에 의거한다. 투쟁은 불일치의 무의식적 지속이 아니라 불일치의 의식적 자기경신⋅자기부정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최고 형태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본질이 불일치라면 불일치의 성립조건으로서 일치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운동적 일치상태에서 어떤 동인에 의하여 그것은 불일치로 전환되며 이 불일치 자체는 계속적 자기경신을 통해 다시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치→불일치→일치’라는 도식은 운동의 회귀적 본질을 요약해준다. 다시 말하면 운동은 자체의 소멸로 나아간다. 따라서 불일치인 운동은 일치로 가는 경로다. 현재 상황에서 투쟁적 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일치로의 회귀다. 이 회귀를 나는 회향이라고 부른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아로서의 인간은 언제나 비아와 대립관계에 들어선다. 이로써 불일치 상태에 처한 인간은 실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은 모두 회향이다. 이 점에서 불교나 기독교 혹은 맑스주의의 문제 해결 과정은 인간학적으로 볼 때 이 회향의 상이한 경로인 것이다.
이 모두는 현재의 불일치⋅대립⋅갈등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인류가 현재 상황 하에서 질곡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등의 운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와 비아의 대립을 아는 존재다. 인류는 현재 상황을 진보적 운동으로써 파괴해야 할 것으로, 또 자신을 해방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해 왔다. 역사는 이처럼 당면 상황을 질곡으로 간주한 자들의 것이었다.
자유와 투쟁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실마리는 자유와 투쟁이라는 두 개념이다.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목적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 결과로 획득되는 자유는 칸트가 말하는 원인으로서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때 원인과 결과로서의 자유는 동일한 것이다. 이 원인적 자유와 결과적 자유는 자연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다. 인간 자신의 손에 이 자유라는 무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역시 인간의 자유에 속한다.
자유는 모든 외적 규정으로부터 무제약적이어야 한다. 즉 자유는 분석적으로 일체의 외적 사실에서 독립된다는 규정을 가진다. 자유는 오직 자유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자유의 복종적 성질이 나타난다. 자유는 내적 복종성과 외적 해방성을 가진다. 양자 모두 자유의 속성이며, 이 양자 중 하나가 우세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 즉 투쟁이 유발된다.
투쟁의 동인은 자기만족이다. 자기만족이 투쟁의 척도가 된다. 이 자기만족이 만인의 것과 같은 부류의 것이면 도덕법과 일치한다. 이 자기만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예지적 정신적 자기만족과 쾌를 수반한 감정적 자기만족이 그것이다.
자유는 무엇에서의 해방이란 명제에는 운동의 방향이 전제된다. 자유는 어떤 운동을 내포하며, 이 운동은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쟁을 의미한다. 자유가 인간의 한 본질이라면 그 투쟁의 동인도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독자적 존재 내지 순수 통일체로 전진하는 운동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양면성, 즉 일면 신적인 예지계에 속하고 일면 감성계에 속하여 늘 갈등하는 인간의 양면성,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인간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그 갈등을 넘어서 완전성에 이를 때까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운동, 즉 투쟁이 지속된다. 이 투쟁은 완전성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자유의 이념인 완전성은 일체의 갈등과 모순과 투쟁이 해소된 상태, 즉 자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가 실현된 완전성 속의 인간이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가적이며 그 갈등이 해소되려면 인간 속성 중의 어느 한쪽, 순수 예지계에 속하든지 아니면 순전히 감성계에 속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전자), 또는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후자).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향은 이 양자의 균형, 일체의 투쟁이 종식된 상태,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고, 이때 인간은 자기존재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순간적이기는 해도 어떤 만족을 얻기도 한다. 현실적인 만족은 예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양자의 균형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 인간에게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균형은 항상 도전받는 것이고 인간의 만족이란 순간에 불과하다. 왜 그것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며 영원한 자족상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일까? 이는 예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균형을 자족의 한 방편으로 삼을 때, 불완전한 인간을 척도로 하며 이때의 자유가 인간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한 자유가 될 때 자유는 이미 인간을 위한다는 조건에 구속되며, 이로써 자유 본연의 존엄성과 멀어진다. 그러한 자유는 이미 본질적 자유가 아니라 사이비 자유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만족상태는 일시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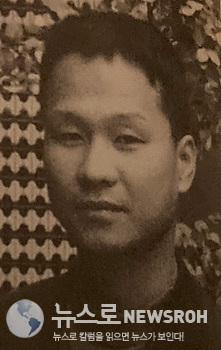
글 현승효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노천희, 내님 불멸의 남자 현승효’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nbnh&wr_id=1